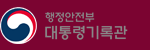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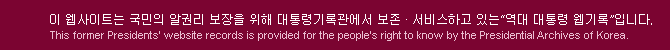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한국은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높아 에너지 비효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 격차는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38%(‘06년)로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주로 기인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성이 대표적인 지표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에 동 분석에서는 에너지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생산량 지수를 활용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 원단위를 도입하여 한·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였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로는 한·일 간 격차가 ‘06년 기준으로 2.2배였으나 생산량 기준으로는 1.2배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① 석유화학산업의 한·일 간 에너지효율성 격차는 7%로 분석되었습니다. 1990년대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0년 이후 설비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신공정·신기술 개발마저 부진하여 에너지효율성이 정체되었습니다. ② 철강산업의 경우, 원료인 고철의 품질 차이 등으로 일본보다 효율성이 약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③ 시멘트산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일본의 절반수준으로 크게 낮아 한·일 간 에너지효율성 격차가 15%에 달합니다. ④ 제지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은 일본보다 21%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타 사업장의 폐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폐지 재활용 확대 및 노후공장 폐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⑤ 비철금속산업도 최신 설비 투자 확대와 신공법 도입으로 에너지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기술·신공정 개발 등 추가적인 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 설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단위를 넘어 산업단지·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기업도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